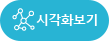| 항목 ID | GC05102184 |
|---|---|
| 이칭/별칭 | 말뚝박는 노래 |
| 분야 | 구비 전승·언어·문학/구비 전승,문화유산/무형 유산 |
| 유형 | 작품/민요와 무가 |
| 지역 | 경상북도 영천시 |
| 집필자 | 박영식 |
| 채록 시기/일시 | 1990년대 초 - 「망개 소리」 김해식에게서 채록 |
|---|---|
| 관련 사항 시기/일시 | 1996년 - 「망개 소리」 영천시에서 발행한 『영천의 민요』에 수록 |
| 채록지 | 망개소리 -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신방동 |
| 가창권역 | 망개소리 -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|
| 성격 | 민요|노동요 |
| 출현음 | 미·솔·라·도·레 |
| 기능 구분 | 잡역 노동요 |
| 형식 구분 | 선후창 |
| 박자 구조 | 6박자 |
| 가창자/시연자 | 김해식 |
[정의]
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에서 땅을 다지기 위해 말뚝을 박으면서 부르는 노래.
[개설]
「망깨소리」는 큰둑을 쌓거나 집터를 다듬기 위해 땅을 다지면서 부르는 노래이다.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‘망깨’라고 하는 쇳덩이를 들어 올려 말뚝을 박는데, 이 민요를 「말뚝박는 노래」라고도 한다.
‘망깨’에 여러 가닥의 줄을 달아서 여럿이 그 줄을 당겼다가 놓는 일을 되풀이하면 말뚝이 박히는데, 민요의 구연은 작업의 동작과 밀착된다.
[채록/수집 상황]
1996년 영천시가 발행한 『영천의 민요』에 실려 있는데, 이는 MBC 라디오 ‘좋은 아침 좋은 가락’ 방송 프로를 위해 1990년대 초반에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으로 현지 조사를 나가 주민 김해식에게서 채록한 것이다.
[구성 및 형식]
「망깨소리」는 선후창(先後唱) 형식으로 구연되는데, 앞사람이 사설을 메기고 뒷사람이 후렴을 받아 합창한다. 지루하고 벅찬 일을 치르기 위하여 흥미로운 사설이 길게 따르는데, 그 사설은 고정되지 않아서 회심곡이 끼어들기도 한다.
빠른 6박 장단으로 되어 있고, 단순한 형식의 민요이다. 노래의 사설은 장단이 빠른 것과 망깨가 무거워 느린 것이 있다.
[내용]
「망깨 소리」-1
에이여로차 / 어이여로차아 / 찬이찬이가 찬이로구나 / 어이여로차아 / 저기가는 저처녀는 / 어이여로차아 / 겉눈을감고서 속눈질한다 / 어이여로차아 / 저기가는 남매장호 / 어이여로차아 / 반달겉은 딸이거던 / 어이여로차아 / 온달겉은 사위나보소 / 어이여로차아 / 딸이상 있건만은 / 어이여로차아 / 나이어려도 못보겠네 / 어이여로차아 / 여보장모님 그말씀마소 / 어이여로차아 / 참새가적어두 알을놓고 / 어이여로차아 / 제비가적어도 강남을간데 / 어이여로차아 / 이구십팔 열여덟살에 / 어이여로차아 / 묵한일을 못하겠소 / 어이여로차아 / 대구원장은 꽤꼬리탄데 / 어이여로차아 / 야무진맏며느리 비틀을탄다 / 어이여로차아 / 찬이찬이가 찬이로구나 / 어이여로차아 / 저무나점두룩 가는길에 / 어여로차아 / 중도보고 소도본데 / 어여로차아 / 열두달말목은 용암궁가고 / 어여로차아 / 천근망깨는 공중에논다 / 어여로차아 / 가만히들어다 콩닥놓자 / 어여로차아 / 찬이찬이가 찬이로구나 / 어여로차아.
「망깨 소리」-2
어여로차아 허야두야 찬이로구나 / 어이여로차아 / 두점말목 땅밑을가오고요 / 어이여로차아 / 열두점말목 용왕국가고서 / 어이여로차아 / 산은조조 골룡산이요 / 어이여로차아 / 물은조조 황화수로데이 / 어이여로차아 / 총각의조조 대국의천자요 / 어이여로차아 / 하야두야 찬이로구나요 / 어이여로차아 / 허바세상 벗님내야 / 어이여로차아 / 이내말씀 들어나보소 / 어이여로차아 / 여자청춘 생각하네요 / 피는꽃과 같은지라 / 어이여로차아 / 연당안에 연꽃피고 / 별당안에 별꽃피고 / 어이여로차아 / 억장호경 앵두화라 / 어이여로차아 / 강남서야 나온제비 / 어이여로차아 / 과과거를 하려하네 / 어이여로차아 / 하숙안의 권번직위 / 어이여로차아 / 권자효술 짝을볼러 / 어이여로차아 / 중남산의 우는부엉 / 어이여로차아 / 호연금을 하려하네 / 어이여로차아 / 동창에는 새벽까치 / 어이여로차아 / 좋은소식 전하든강 / 허야두야 찬이로구나 / 어이여로차아.
[의의와 평가]
사설이 2음보 1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조로운 노동과 결부되는 민요이기 때문에 민요의 원초적 형태로 꼽을 수 있다.
- 『영천의 민요』(영천시, 1996)
- 『충효의 고장 영천』(박약회영천지회, 2006)
-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(http://encykorea.aks.ac. kr)